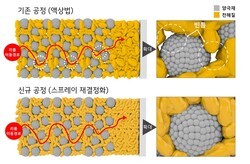10년 넘는 인허가 과정에 불확실성 높아, 글로벌 기업 철수
"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통해 정비해야"

탄소중립 시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한국의 높은 규제의 벽이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다.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과 높은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복잡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행정 리스크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 오스테드, 독일 RWE, 노르웨이 에퀴노르 등 글로벌 풍력 강자들이 앞다퉈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최근 들어 연쇄 철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에너지 대기업 셸(Shell)은 지난해부터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철수 수순을 밟아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의 지분 80%를 헥시콘에 매각하고 한국 시장에서 손을 뗐다.
글로벌 풍력 터빈 빅3 중 하나인 GE 버노바 역시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며, 지난 10여 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퇴장했다. 업계에서는 다른 해외 풍력개발기업들도 한국 시장 인력 감축을 단행하며 철수 준비에 나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10개 부처 29개 법률… "규제 미로"에 갇힌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업 불확실성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서는 10개 부처의 29개 관련 법규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모든 단계를 도맡아야 하며, 절차는 중복되고 까다로워 개발기간만 최대 10년이 넘는다.
반면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은 중앙정부가 입지 선정, 환경평가, 인허가를 통합해 '원스톱샵' 방식으로 처리한다.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4~7년으로 단축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 수립과 실행에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해상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국가보다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대비 사업성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글로벌 기술력과 자본을 흡수할 기회가 사라지고 국내 해상풍력 시장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법 시행 앞두고도 여전한 '규제 공화국'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 3월부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정부가 입지를 직접 선정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며, 인허가 절차도 '해상풍력특별위원회'를 통해 통합 심사·승인 처리해 사업 추진의 예측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조차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법률에 포함된 세부 인허가 기준과 기존 사업자 처리, 환경성 평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까지 해상풍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허가 과정 줄인 특별법 내년 시행… 하위법령이 관건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특별법이 논의될 당시부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우려사항"이라며 "풍력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모아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처럼 사후 규제 중심에서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 중심 접근법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코리아 패싱'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해상풍력 강국을 꿈꾼다면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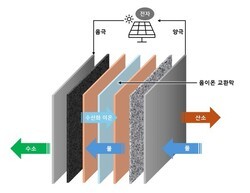

![[그린리더를 만나다] AI·데이터·과학으로 무장한 해양쓰레기 해결사, 홍선욱 오션 대표 인터뷰](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5155_307389_180_1764116282_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