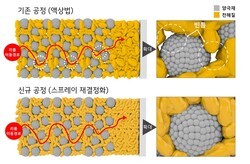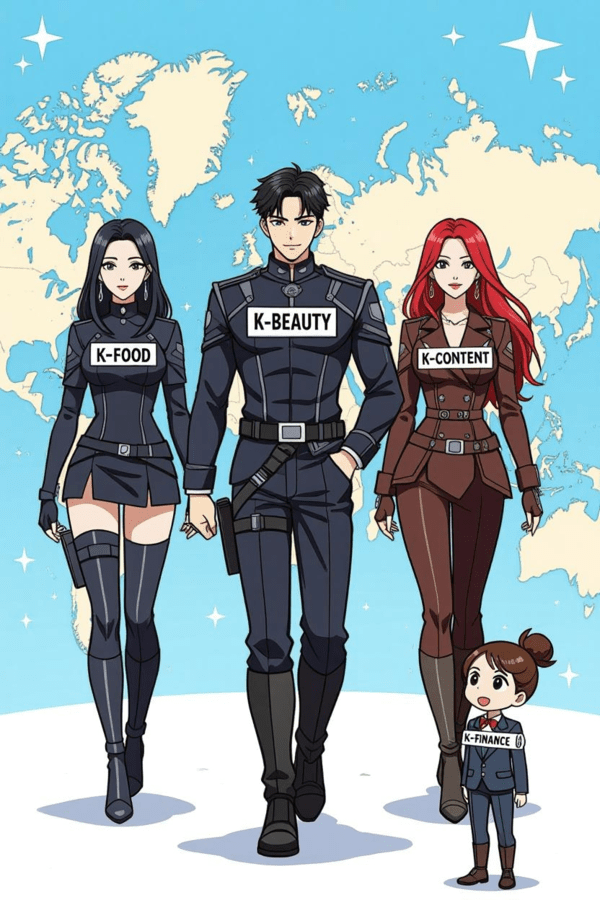
국내 식품·화장품·콘텐츠 등 ‘K-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사이, 국내은행은 해외시장 실적이 전체 이익의 10% 수준에 불과해 존재감이 미미한 모습이다. 국내에서 지속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은행이 해외를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 '68%' 아시아
4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지점·현지법인·사무소) 수는 총 206개(41개국)로 집계됐다. 2023년 말(202개)보다 4개 증가했으나 2022년 말(207개)과 비교하면 1개 감소해, 사실상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도(20개)가 가장 많고, 미국(17개)·중국(16개)·미얀마(14개)·홍콩(1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봐도 아시아에 68.0%(140개)가 집중돼 있다. 작년에 인도에서만 우리은행(2개)과 KB국민은행(2개)이 4개 지점을 신설했다.
해외점포의 순이익은 △2022년 9억9100만달러 △2023년 13억3000만달러 △2024년젼 16억1400만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은행 순이익(22조2000억원)의 10.7% 수준이다. 특히, 작년 순이익(16억1400만달러) 중 28.0%가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발생했다.
4대 은행 10%↑… 선진 시장서 부진
올해 상반기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 해외법인 순이익이 4653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10% 늘었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KB뱅크)의 손실 폭을 줄였고, 캄보디아에서 선전했다. 신한은행은 일본 SBJ은행과 미국·유럽 법인들의 안정적 성과에 힘입어 실적을 지탱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우리소다라은행)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로 충당금을 쌓아 순이익이 325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유럽·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성과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캐나다·독일 등에서 금리 하락과 환율 충격으로 이자수익이 줄며 상반기 해외 순익이 약 36% 감소했다. 캐나다신한은행도 상반기 13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우리은행 중국 법인은 52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진입장벽 높은 구조적 한계
업계에서는 선진국 금융시장은 현지 은행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이미 장악한 구조여서, 후발 주자인 국내은행이 자리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각국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규제와 현지 인력을 통한 내부통제 부담 등도 진입장벽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작년 3월 기준 일본 3대 금융그룹의 해외영업 비중은 MUFG(57%), SMFG(58%), 미즈호(67%) 등 모두 50%를 넘겼다. 특히, SMFG·미즈호의 해외 비중은 2013년 각각 19%·22%로, 10여 년 만에 약 2~3배 성장했다.
삼일PwC회계법인 FS부문은 지난 4월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 3대 금융그룹의 해외진출 전략으로 △미국 등 선진국 중심 △기업투자금융(CIB) 중심 △핀테크기업 및 디지털은행에 투자 등의 영업 확대를 꼽았다.
MUFG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모건스탠리 우선주에 9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후 MUFG는 미국 내 인수금융에 본격 참여했다. 이를 통해 그간 약점으로 인식되던 기업투자금융 영역을 확대했다.
일본 3대 금융, 10여 년간 '퀀텀 점프'
SMFG는 2023년 미국에 디지털은행인 ‘지니어스 뱅크(Jenius Bank)’를 출범하고, 무점포 디지털 소매금융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니어스 뱅크는 설립 1년도 안돼 10억달러의 예금을 유치했다.
삼일 FS부문 관계자는 “국내 4대 금융지주도 지난 10여 년간 영업이익 중 해외 비중이 2013년 4.3%에서 2024년 11%로 크게 증가했다”라며 “그러나 다음 10년의 퀀텀 점프를 위해 동남아를 넘어 선진국을 포함한 지역에서 리테일뿐 아니라 CIB, 핀테크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목할 영역으로 확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훈 우리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 금융그룹은 팬데믹 이후 해외 부문의 이자이익 확대가 실적 개선을 주도했고, 2024년 국내 부분 이자이익 증가율이 해외 부문을 상회했다”며 “국내 금융그룹은 저평가 국면을 돌파한 이후 자산 구조를 재편하며 새로운 도약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 금융그룹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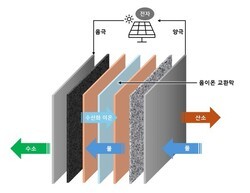

![[그린리더를 만나다] AI·데이터·과학으로 무장한 해양쓰레기 해결사, 홍선욱 오션 대표 인터뷰](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5155_307389_180_1764116282_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