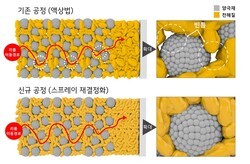단 네 달 만에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 장중 3750까지 치솟았다.
한때 꿈의 숫자로 불리던 지수가 이제는 일상적인 수치가 됐지만, 그 속도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내년 상반기 4200도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너무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50% 이상 상승했다. 상승의 동력은 명확하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AI 산업의 성장,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결합된 유동성 랠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만 원대, 45만 원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 부족이 반도체 가격을 밀어올렸고,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하지만 지수 상승 속도에 비해 기업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이다.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코스피의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이미 역사적 평균치를 훌쩍 넘어섰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주가가 이익 증가 속도를 앞지르며 고평가 논란이 재점화되는 이유다.
여기에 외부 변수도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 안팎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단기에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통화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지금의 랠리는 쉽게 꺾일 수 있다.
‘AI 슈퍼사이클’과 ‘유동성 랠리’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승장은 언제든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최근 4개월간 700포인트가 오른 속도는 지난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새로운 국면을 연 것은 맞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입을 모은다.
달아오른 시장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끝없이 부풀리고 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다시 시장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역대 모든 상승장은 ‘이번만은 예외’라는 확신에서 무너졌다. 2021년 9만 원을 넘겼던 삼성전자가 불과 1년 반 만에 5만 원대로 주저앉았던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AI, 반도체, 수출 회복이란 낙관론이 가득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버티는 장세”라며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결국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무뎌지지만, 냉정함을 잃는 순간 조정은 더 깊어진다”고 경고했다.
코스피는 지금 단기 성과에 도취된 시장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사천피’라는 숫자가 현실화되더라도 그 안에 실적, 펀더멘털, 수익성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모래 위의 성일 뿐이다. 시장이 웃는 지금이야말로 냉정해야 할 때다.
너무 빠른 상승 뒤엔 언제나 균형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지금의 과열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생존 원칙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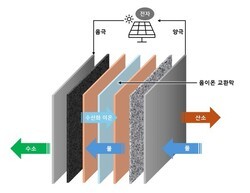

![[그린리더를 만나다] AI·데이터·과학으로 무장한 해양쓰레기 해결사, 홍선욱 오션 대표 인터뷰](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5155_307389_180_1764116282_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