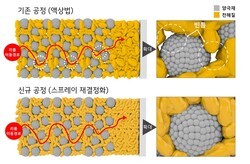VEU 철회 시 중국 공장 장비 반입마다 美허가 받아야
중국에서의 성장 저지 전략, 韓 민-관 "면밀한 소통, 대응 방안 찾을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돌발 조치에 긴장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두 기업의 중국 내 생산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장비 반입과 유지보수 과정마다 미국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불거진 예기치 못한 변수에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 美 상무부 “VEU 폐지”… 중국 내 성장 차단 의지 드러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의 중국 내 생산 거점에 적용되던 VEU 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VEU 제도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한해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특정 품목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허가 체계다.
당초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 등 우려국가에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차질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VEU 지위를 부여해왔다. 실제로 두 기업은 2023년 10월부터 전 품목에 대해 VEU 적용을 받아 첨단 장비를 수월하게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상황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앞으로 두 기업은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상무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일 관보에 정식 게시된 뒤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첨단 공정 전환과 장비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다. 장비 교체가 지연되면 기술 경쟁력은 물론 생산 효율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VEU 철회가 현실화되면 중국 내 생산기지 운영이 단기 차질을 넘어 중장기 성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시안 1·2공장에서 전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5~40%를 책임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우시 공장에서 D램 생산량의 약 40%,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공장의 유지·보수는 허가하겠지만, 생산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는 사실상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현상 유지’ 수준에 묶어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차분한 대응 기조…“120일 내 방법 찾을 것”
그럼에도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일 “한·미 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업 영향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여러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 철회로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통해 기업 피해 최소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안감이 존재한다. 실제 삼성전자의 1일 주가는 3.01% 하락한 6만7600원에 마감됐으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83% 하락한 25만6000원에 마감됐다. 미국의 VEU 철회 발표가 영향을 줬다는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온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는 장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생산 거점 다변화와 정부 간 외교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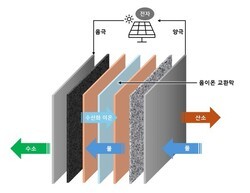

![[그린리더를 만나다] AI·데이터·과학으로 무장한 해양쓰레기 해결사, 홍선욱 오션 대표 인터뷰](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5155_307389_180_1764116282_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