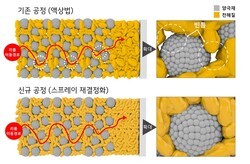M&A 무산율 2020년 1.1%→2024년 4.6%
정보 비대칭·가치평가 불명확… 중소기업일수록 무산율↑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무산율이 5년 사이에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1%에 불과했던 M&A 무산율이 지난해 4.6%까지 치솟았다.
11일 그린포스트코리아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를 통해 기업 M&A 관련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20년 1318건 △2021년 1307건 △2022년 1239건 △2023년 989건 △2024년 1209건의 M&A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산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29건 △2022년 41건 △2023년 42건 △2024년 5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무산율은 1%대에서 2%, 3%, 4%대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기준으로 진행된 M&A 거래 20건 중 1건꼴로 성사되지 못하고 깨진 셈이다.
M&A는 기업 간의 합병뿐 아니라 지분 양수·양도, 교환, 출자, 최대주주 변경 등 형태가 다양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트 공시 중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합병 결정’ 등 지배구조 변화와 직접 연결되는 공시들을 중심으로 거래를 분류했다. 기본적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한 거래만 인수합병 사례로 분류했으나, 지배력 강화 목적의 추가 지분 취득 건(51%에서 70%로 지분 확대 등)도 보조적으로 포함해 분석했다.
M&A가 무산된 사례는 ‘합병 계약 해제’, ‘경영권 인수 철회’, ‘주식양수도 무효’, ‘스팩(SPAC) 합병 취소’ 등 사실상 중단된 거래만 포함했다.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건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또한 M&A 당사자 양측이 각각 공시를 올리는 구조상, 같은 거래가 두 건으로 집계된 경우도 포함했다. 예컨대 한 기업이 타법인 지분을 취득한다고 공시하면, 그 지분을 넘긴 기업도 지분 처분 또는 양도 공시를 별도로 올리게 된다. 이 같은 중복 공시는 전체 통계 수치에는 포함했지만, 분석 과정에서는 단일 거래로 간주해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산된 M&A 거래의 상당수는 상대방의 자금 조달 실패에서 비롯됐다. 잔금 납입 지연, 투자자금 유치 실패, 계약금 미이행 등 계약상 자금 투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사 결과 불확실성이 커져 계획이 백지화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 대기업들은 이야기가 달랐다. 냉각된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굵직한 M&A를 성사시키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 실사 대응 경험에서의 차이가 인수합병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공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며 생산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M&A였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을 인수해 전기차 배터리 원료 내재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인수로 인해 배터리 소재 수급 안정성과 기술 자립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SK그룹은 2022년 미국 수소 에너지 스타트업을 인수해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했으며, CJ ENM도 같은 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카카오 또한 2021년 게임사 크래프톤의 지분 일부를 전략적으로 인수해 게임 IP 확장과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5년 사이 인수합병 무산율이 뚜렷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자본시장 침체와 주가 하락에 따른 가치 인식의 변화를 지목한다. 거래 당사자 간 ‘가격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과거보다 잦아졌다는 분석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침체기가 오면 인수합병 무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수자 입장에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이 바뀌고, 매도자 입장에선 ‘지금 가격에 팔 순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거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국면에선 계약을 맺어놓고도 파기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며 “부동산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거래를 접는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더 자주 무산되는 배경에 대해선 정보 비대칭성, 거래 구조의 비정형성, 중개 네트워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박 부원장은 “중소기업은 기업가치 평가 자체가 쉽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서 인수합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회계법인, 증권사 등 전문 중개 네트워크가 붙으면서 딜이 성사되기 쉬운 반면, 중소기업 M&A는 수수료 자체가 작고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 중개인들도 잘 붙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정형화된 모델이 있지만, M&A는 그렇지 않아 정보 비대칭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작은 기업일수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비효율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수합병 공시 체계는 형식상으로 마련돼 있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보 비대칭성과 공시의 비일관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유형의 거래라도 공시 제목과 형식, 공개 내용이 기업마다 제각각인 데다 계약 무산 시에는 별도의 공시 없이 종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진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가치평가 방식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무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몸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기준으로 삼거나(DCF),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해 시세를 정하는 방식(EV/EBITDA) 등이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는 수십억 원씩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하거나 보증해주는 제도도 사실상 없다. 결국 거래 막판까지 가격 눈높이가 맞지 않아 파기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 증권사 IB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M&A는 딜 사이즈가 작고, 비정형적 구조가 많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공시 기준이나 가치평가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지 않으면 실제 거래 현장에선 계약 직전 무산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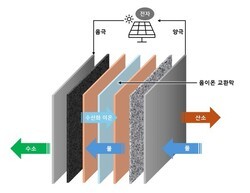

![[그린리더를 만나다] AI·데이터·과학으로 무장한 해양쓰레기 해결사, 홍선욱 오션 대표 인터뷰](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5155_307389_180_1764116282_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