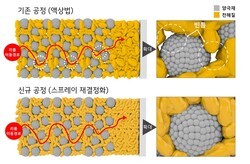국립생물자원관-영주시, 바이오 업계 요구 자생종 대량 증식지 마련키로
연평균 수출액이 200만 달러(약 23억 원) 이상 쑥쑥 성장하는 '자생 식물'이 있다. 국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식물의 수출액은 2009년 기준 500만 달러(약 58억 원) 수준이던 수출액이 2013년 기준으로 1,400만 달러(약 161억 원)로 대폭 성장했다. 페루가 원산지인 '마카(Maca)' 얘기다.
마카는 국내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건강 기능 식품이다.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 여기에 천연 미네랄까지 함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페루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고마운 생물자원이다.
그러다보니 중국 업체들도 마카 생산과 판매, 그리고 특허 제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페루산 마카 대신 자국에서 마카를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마치 '문익점'처럼 마카 씨앗을 가져와 심고 재배해 팔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국제조약 상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
이유는 2014년 9월 발효된 유전자원의 이익 및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때문이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타국의 기업 등이 페루의 고유 생물자원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페루 정부나 농민들에게 판매액 중 일부를 '개런티'로 지불해야만 한다. 중국 업체들이 지키지 않은 부분이다.
실제 영국 가디언지의 지난해 2월9일자 '페루산 마카 붐, 중국의 재배로 하향 평준화하나' 보도는 이같은 분쟁을 예고했다.
가디언지는 페루의 '국가 생물해적 위원회'가 250건의 마카 관련 특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특허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미 20건 정도에 대해서는 생물해적 행위로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쟁이나 추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외 생물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산업계 입장에서는 수출국에 앞으로 내게 될 개런티 부담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KEI)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내 바이오 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년에 최대 5,069억원에 달한다. 현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담을 피해 갈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으로 원료를 대체하면 된다. 물론 같은 효능이 있는 생물자원이어야만 한다. 바이오 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실제 업계의 이같은 '니즈'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일 경북 영주시와 '야생 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 내용을 보면 영주시에서 바이오 업체가 대체 원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야생 식물을 대량 증식한다는 게 요지다. 화장품 개발 업체인 한국콜마나 전문 의약품 전문 기업인 동아에스티 등이 이 협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테스트 베드' 차원에서 영주시에 대량 증식을 위한 시범용 밭을 운영하고 농가와 계약 재배를 연계하려 한다"며 "우선 5개 종 정도의 자생 식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이하자면 기업들이 대체를 원하는 5종의 국산 식물을 영주시에서 재배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재배한 생물자원은 현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생물자원의 대체재로 쓰이게 된다.
한편 생물자원관에서는 현재 60여 종의 국내 자생생물에 대한 국가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해당 특허는 물품에 대한 공장도 단가와 판매 수량 대수, 기여율 등을 토대로 산정한 사용료를 정부에 지불하면 어떤 기업이나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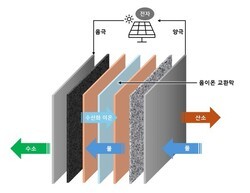

![[그린리더를 만나다] AI·데이터·과학으로 무장한 해양쓰레기 해결사, 홍선욱 오션 대표 인터뷰](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5155_307389_180_1764116282_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