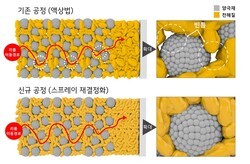친환경 정책 도입했다 철수하는 기업들 속출...실효성 의문 도마위
![[사진=인공지능 생성이미지]](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photo/202507/302760_303524_5640.png)
유통업계가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친환경 정책들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각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카페업계의 종이빨대부터 배송업계의 다회용 포장재, 화장품업계의 친환경 패키징까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지난달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재도입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는 2018년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을 선언하며 글로벌 유통업계의 친환경 바람을 이끌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2025년, 종이빨대 정책의 사실상 '유턴'을 시작했다.
종이빨대로 교체한 결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종이가 소모됐고 제조 비용도 급증했다. 무엇보다 내구성 문제로 고객 불만이 잇따랐다. 환경부 역시 현재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를 진행하며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의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빨대 논란과 유사한 딜레마는 배송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급증과 함께 등장한 다회용 포장재는 배송업계의 혁신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근본적 문제는 폐기 시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회용 보냉팩이 수명을 다한 후에는 결국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환경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관리 비용 증가와 물류 효율성 문제까지 겹쳤다. 회수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소비자들이 보냉백에 각종 쓰레기를 넣어 반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포장재 분류와 세척을 위한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해지면서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운영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SSG닷컴은 배송 업무를 대한통운에 완전 외주화하면서 자체 운영하던 알비백 사업을 중단했으며, 롯데도 유사한 이유로 다회용 포장재 사업을 폐기했다. 그나마 쿠팡만이 프래시백과 종이박스 체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수명이 다한 프래시백도 수출용 팔레트로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다. 화장품업계에서도 친환경 패키징이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니스프리의 '페이퍼 보틀'이다. 소비자들은 100% 종이 용기로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과 종이의 혼합재질이었다. 그린워싱 논란으로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했다.
아모레퍼시픽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70% 줄인 종이튜브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화장품 용기는 내용물 보호와 디자인 차별화를 위해 복합재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LCA(생애주기 평가) 없이 겉보기에만 친환경적인 대안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유통업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친환경 제품들은 LCA 인증을 받거나 제3자 검증기관의 평가를 거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친환경보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마케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부터 SSG·롯데의 다회용 포장재 폐기, 화장품업계의 친환경 패키징 철수까지, 이번 시행착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면서 "친환경이 단순히 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 전체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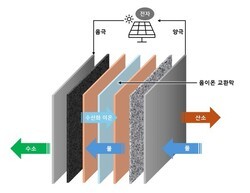

![[그린리더를 만나다] AI·데이터·과학으로 무장한 해양쓰레기 해결사, 홍선욱 오션 대표 인터뷰](https://cdn.greenpostkorea.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305155_307389_180_1764116282_250.jpg)